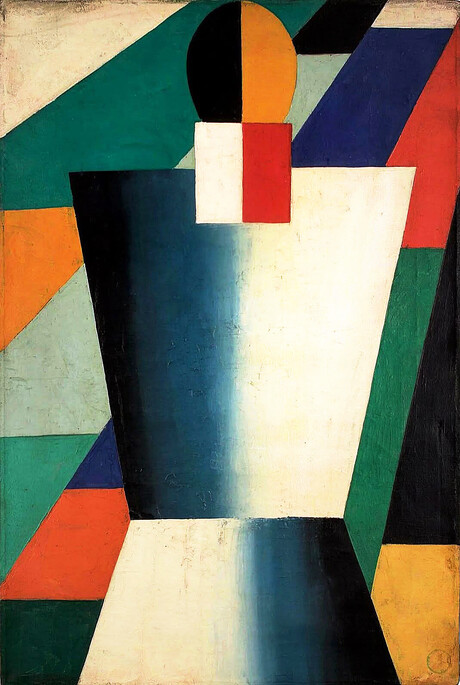네덜란드 황금시대 풍경화의 절대적 거장

[K라이프저니|고요비 기자] 야코프 판 라위스달(Jacob van Ruisdael, 1628~1682)은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풍경화의 최고 거장이다. 하를럼에서 태어나 암스테르담에서 생을 마감한 그는, 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르가 인물화와 실내화의 정점을 대표한다면 풍경화의 영역에서는 라위스달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미술사계의 일관된 평가다. 화가인 아버지와 역시 저명한 풍경화가였던 삼촌 살로몬 판 라위스달의 영향 아래 성장한 그는 십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작품을 남기기 시작했으며, 평생 700점이 넘는 유화와 드로잉을 제작했다.
라위스달의 미술사적 위치는 '네덜란드 리얼리즘(Dutch Realism)'의 정점이자 완성자로 규정된다. 그는 자연을 이상화하거나 종교적 상징으로 종속시키는 이전 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실제로 관찰한 네덜란드의 하늘과 대지와 물을 있는 그대로의 웅장함으로 화폭에 옮겼다. 그의 영향력은 18~19세기 영국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과 J.M.W. 터너에게 직접 이어지며, 나아가 바르비종 화파와 인상주의의 자연관에까지 그 맥이 닿는다. 풍경화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감정과 철학의 언어로 끌어올린 화가로서, 라위스달은 서양 풍경화사에서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이름이다.
화면의 3분의 2를 하늘에 바친 구도—그림의 화법과 내용
1660년경 제작된 '베이크 바이 뒤르스테더의 풍차(Windmill at Wijk bij Duurstede)'는 캔버스에 유채로 완성된 83×101cm의 작품이다. 주제는 위트레흐트 주 렉 강변에 실재하는 소도시 베이크 바이 뒤르스테더의 풍차 풍경이지만, 라위스달의 손을 거치면서 단순한 지형 기록을 훌쩍 넘어선 무언가가 되었다.
화면 구성의 핵심은 극적인 비율 배분이다. 전체 화면의 약 3분의 2가 하늘에 할당되어 있다. 무거운 적란운 덩어리들이 회색과 흰색, 그리고 은빛 사이를 오가며 화면 전체를 압도하고, 그 사이로 청명한 파란 하늘이 좁게 열려 있다. 이 극적인 구름의 드라마 아래, 화면 오른편 중앙에 풍차가 하늘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다. 풍차는 단순한 풍경 요소가 아니라 화면 전체의 수직적 중심축이자 인간 문명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화면 하단 왼편으로는 강물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흐르고, 그 위에 흰 돛을 단 범선 두 척이 떠 있다. 오른편 전경에는 오래된 목조 방파제 말뚝들이 물에 잠긴 채 늘어서 있으며, 풍차 발치에는 세 명의 여인이 작고 조용하게 서 있다. 인물들은 의도적으로 매우 작게 처리되어, 광대한 자연의 스케일 속에서 인간 존재의 상대적 왜소함을 암시한다. 전경의 갈대와 젖은 모래, 부서진 말뚝들은 네덜란드 특유의 습하고 바람 많은 풍토를 섬세하게 재현한다.
빛의 처리는 라위스달 특유의 역량이 가장 선명하게 발휘되는 부분이다. 구름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이 풍차의 일부와 강면, 그리고 원경의 도시 실루엣을 선택적으로 밝히고, 나머지 부분은 구름 그늘 속에 가라앉혀 화면 전체에 강렬한 명암 대비를 만들어낸다. 이 빛과 그림자의 교차가 정지된 풍경에 살아 있는 대기의 운동감을 불어넣는다.
민족의 자부심을 담은 풍경—그림의 가치와 의미
이 작품이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네덜란드 미술사의 상징적 걸작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미술사적으로 이 작품은 하늘과 구름을 독립적인 회화 주제로 끌어올린 선구적 사례다. 라위스달 이전까지 하늘은 대개 지상 풍경의 배경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하늘은 서사의 주역이며, 이는 훗날 컨스터블이 구름 연구에 몰두하는 직접적인 영감이 되었다.
또한 이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다. 스페인 지배에서 독립한 후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네덜란드인들에게 풍차는 물과 싸워 땅을 일군 삶의 상징이었다. 바람과 물과 인간의 노동이 만나는 접점인 풍차를 웅장한 하늘 아래 우뚝 세운 이 그림은, 자연에 맞선 네덜란드 민족의 의지와 자부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레이크스뮤지엄이 이 작품을 핵심 소장품으로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바람이 들리는 그림—감상자의 마음에 남는 감정
이 그림 앞에 서면 가장 먼저 하늘이 온몸으로 밀려온다.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살갗으로 느끼는 하늘이다. 바람의 무게와 습도, 곧 쏟아질 것 같은 구름의 긴장감이 화폭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다. 강면에 반사되는 은빛 빛줄기와 구름 그늘이 교차하는 풍경은, 네덜란드의 가을 오후 어느 순간을 그대로 정지시켜 영원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
풍차는 그 장엄한 하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에 맞서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은 숭고하고도 쓸쓸하다. 발치의 세 여인은 말없이 그 풍차를 올려다보는 듯하고, 관람자 역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을 따라 하늘과 풍차를 바라보게 된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고, 그러나 그 작은 인간이 세운 풍차는 크다. 라위스달은 그 역설 속에 네덜란드의 영혼을 담았다.
레이크스뮤지엄의 불가침 보물—시장이 매길 수 없는 가격
'베이크 바이 뒤르스테더의 풍차'는 암스테르담 레이크스뮤지엄의 핵심 소장품으로, 경매 시장에 등장하지 않는 국가 문화재급 작품이다. 라위스달의 작품은 세계 유수 미술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으며, 공개 경매에 출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장 참고 가격을 가늠하자면, 라위스달의 주요 풍경화는 크리스티, 소더비 등 국제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내외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2005년 소더비 런던 경매에서 그의 폭포 풍경화가 약 500만 파운드에 낙찰된 바 있으며, 주요 작품일수록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 상단은 열려 있다. 다만 레이크스뮤지엄 소장의 이 대표작은 렘브란트의 '야간순찰'과 나란히 네덜란드 미술의 상징으로 자리하는 작품인 만큼, 금전적 환산 자체가 무의미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구름은 500년째 그 하늘 위를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풍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람을 맞고 있다.
klifejourney2025@gmail.com
[저작권자ⓒ K라이프저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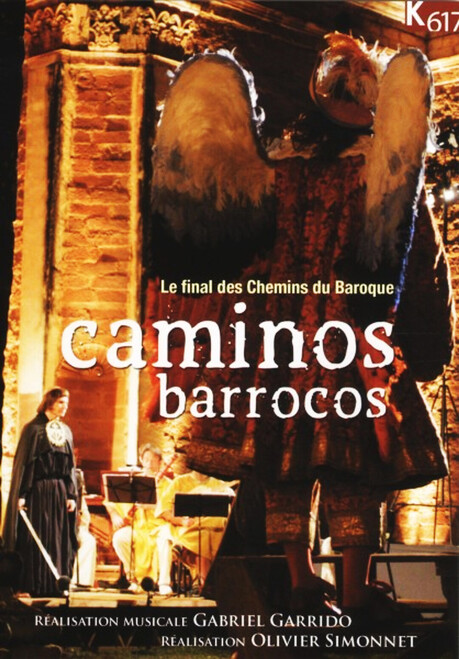






![[이 소리] 250년 만에 되살아난 최초의 독일어 오페라](https://klifejourney.com/news/data/2026/02/16/p1065613667946124_931_h2.jpg)
![[이 소리] 바로크 음악의 신대륙 여정](https://klifejourney.com/news/data/2026/02/16/p1065591887033652_406_h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