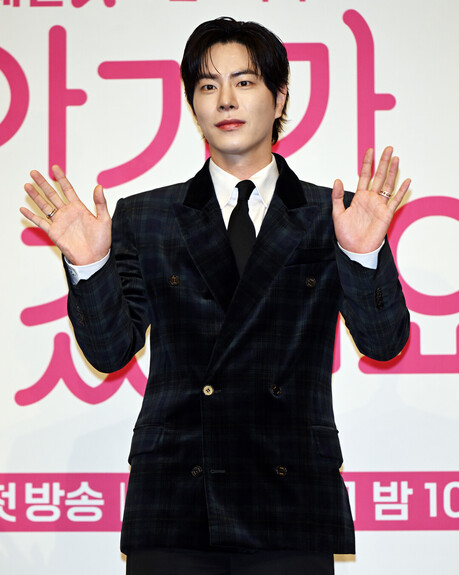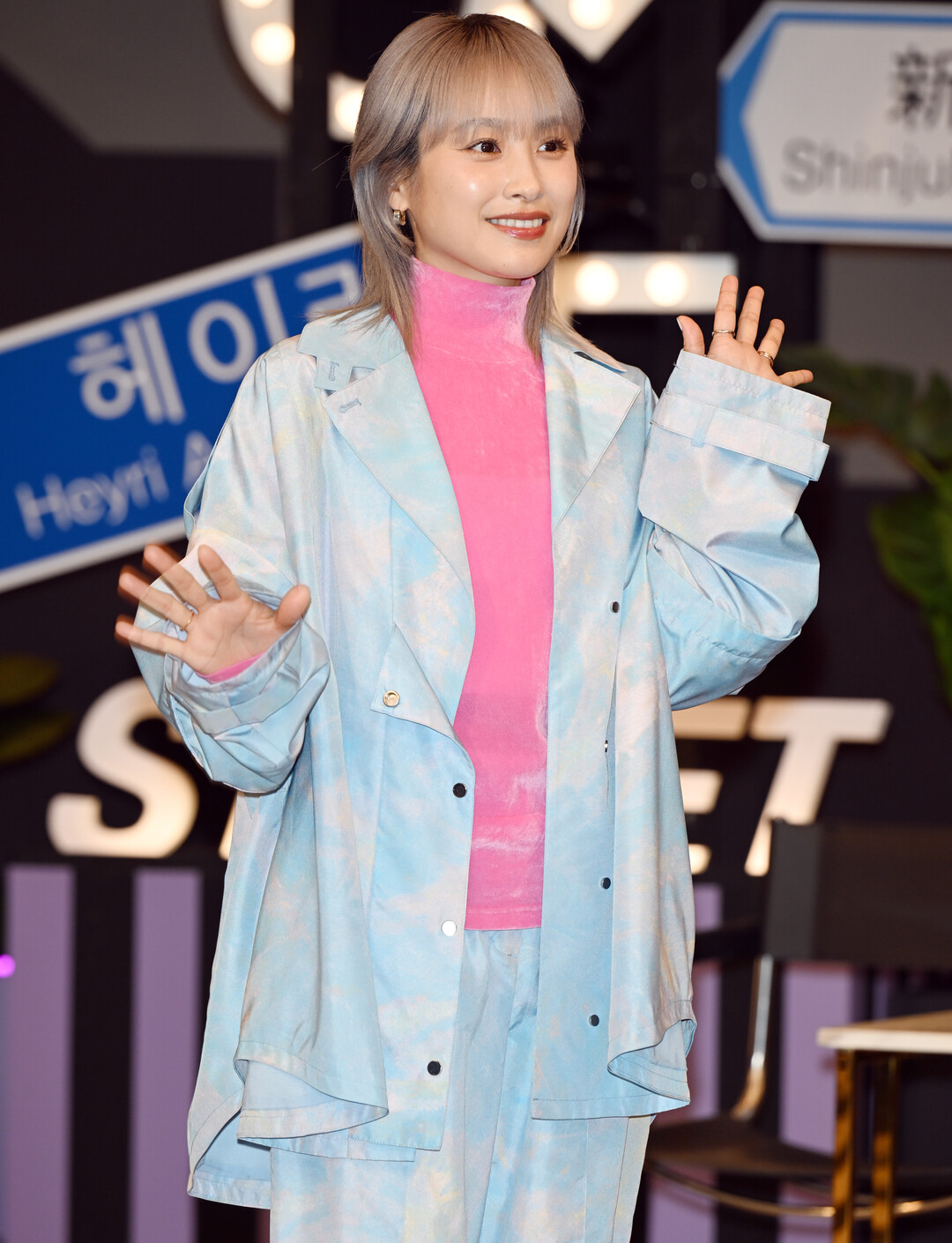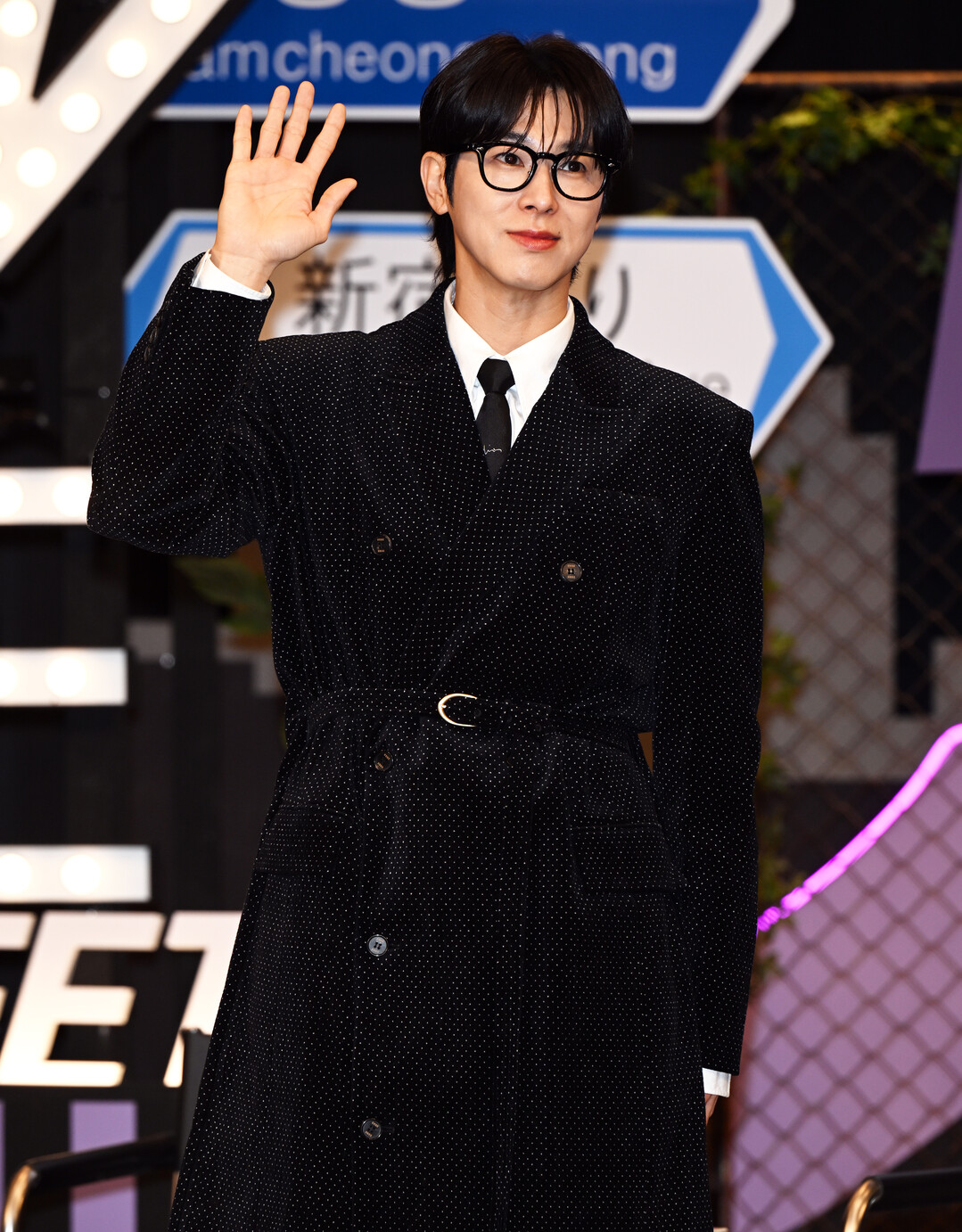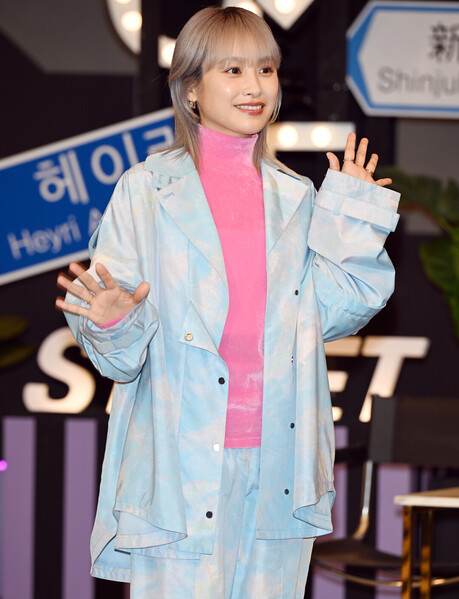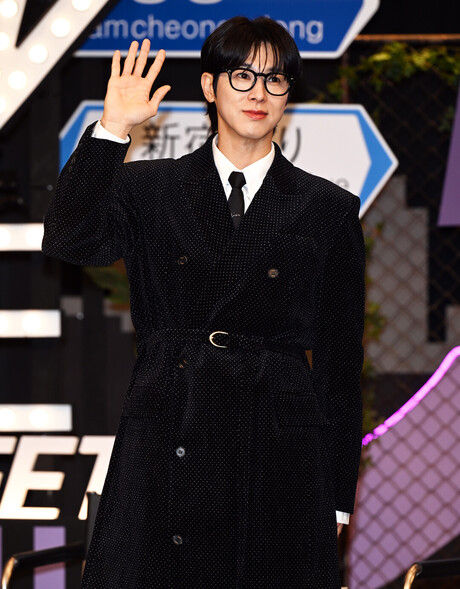[K라이프저니 | 이여름 기자] 선명한 터키블루 배경 위에 놓인 투명한 빨간색 정사각형.
이 작품은 마크 로스코가 평생 추구했던 '색면 회화(Color Field Painting)'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로스코는 "나는 색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인간의 기본 감정들-비극, 황홀경, 파멸-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색을 통해서만 이를 표현했다.
이 작품의 빨강은 로스코의 후기작을 연상시키는 강렬함을 지닌다. 그러나 불투명한 캔버스 위의 빨강이 아닌, 투명한 레진이나 유리를 통한 빨강은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 빛이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명도의 변화, 그림자의 층위, 반사되는 하이라이트는 로스코가 꿈꿨던 '색채를 통한 초월적 경험'을 물질적으로 구현한다.
작품의 구조는 로스코의 전형적인 구성을 따른다. 지배적인 빨간색 면, 그것을 감싸는 청록색 프레임, 그리고 우하단의 작은 오렌지-노란색 포인트. 로스코가 즐겨 사용했던 '색면의 중첩과 대비'가 3차원적 투명성으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빛의 역할이다.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이 어두운 공간에서 관람되기를 원했고, 빛이 그림 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랐다. 이 작품에서 빛은 표면을 넘어 투과하고, 굴절하며, 공간 전체를 감정의 장(場)으로 변환시킨다. 빨강은 더 이상 캔버스 위의 물감이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감정의 파장이 된다.
로스코는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서 운다"고 말했다. 그 눈물은 형태나 서사가 아닌, 순수한 색채가 촉발하는 원초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 '레드 스퀘어' 역시 아무런 이미지도, 상징도 제거한 채 오직 빨강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제시한다.
로스코의 비평적 관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현대성은 명확하다. 투명성이라는 물질적 특성을 통해 빛과 색, 공간과 감정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그것은 로스코가 평면 회화의 한계 안에서 고민했던 '색채의 영적 차원'을 새로운 매체로 확장한 시도이다.
다만 로스코라면 한 가지를 지적했을 것이다. 표면의 반사와 하이라이트가 지나치게 물질성을 강조한다는 점. 그는 매트한 표면을 선호했고, 빛이 흡수되어 색 자체가 발광하는 듯한 효과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 작품의 투명성은 다른 방식으로-빛의 투과를 통해-같은 목표에 도달한다.
결국 이 작품은 로스코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색면 회화가 21세기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 투명한 빨간 정사각형은, 그에 대한 가능한 답변 중 하나다.
klifejourney2025@gmail.com
[저작권자ⓒ K라이프저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