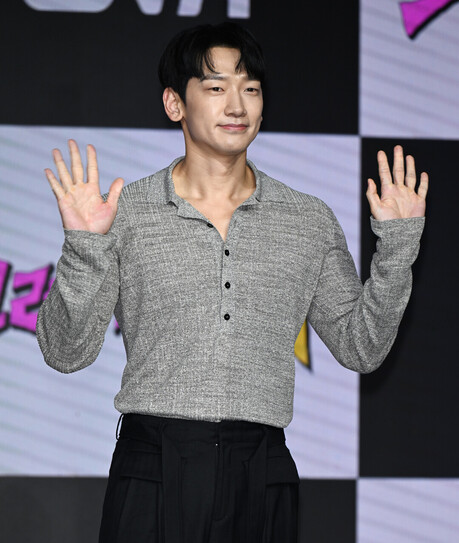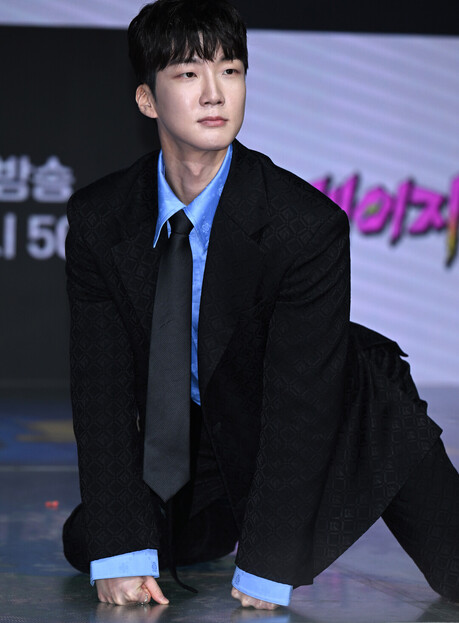[K라이프저니|글·사진 이주상 기자] 창가의 빛이 음영을 만들며 경계를 구분합니다. 빛이 없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빛이 경계를 만들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혹 인간이 빛의 놀림에 흔들려 경계가 아닌 경계, 경계가 없는 경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의심해 봅니다. 경계 속에 있지만 가운데 흐릿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원래 있었건 걸까요. 아니면 경계에 맞서 몸부림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빛의 문법
여기, 빛이 긋는 선이 있다
벽을 가로지르는 각도의 언어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명료한 칼날.
그러나
그림자는 묻는다
경계란 무엇인가
빛의 끝인가, 어둠의 시작인가.
창틀이 만든 삼각형 안에서
또 다른 삼각형이 숨 쉰다
겹쳐진 형태들은 서로를 지우지 않고
투명하게 공존한다
나는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듯이
너의 윤곽이 내 안을 통과한다는 듯이.
오후의 햇살이 옮겨갈 때
이 모든 경계는 흐르고
벽은 여전히 그 자리인데
그 위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경계란 우리가 그은 선이 아니라
빛이 머무는 방식
시간이 흐르는 속도
바라보는 이의 눈높이.
가장 선명한 것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그림자는 빛보다 오래 머물지 못한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벽은 캔버스가 되고
평범한 오후는 기하학이 된다.
무경계란
경계가 없음이 아니라
경계가 춤추는 것
고정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
창밖의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이 선들도 떨린다
견고해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
나와 너 사이
있음과 없음 사이
지금과 이후 사이
그 사이에 빛이 있을 뿐.
klifejourney2025@gmail.com
[저작권자ⓒ K라이프저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