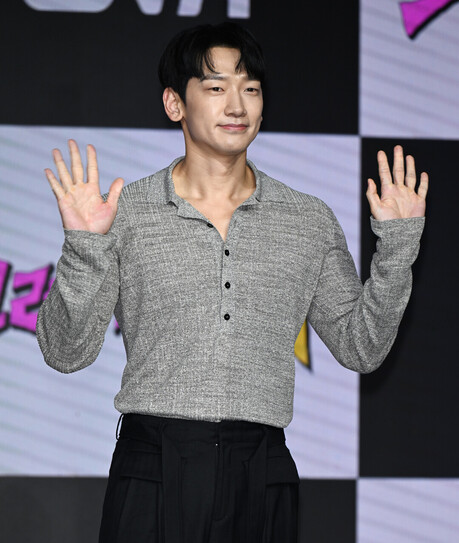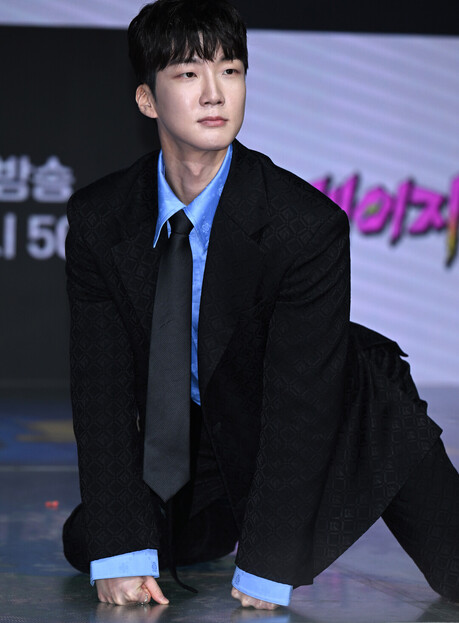[K라이프저니|고요비 기자] 독일 화가 오스카 츠빈처(Oskar Zwintscher, 1870-1916)의 1898년 작품 '슬픔(Grief)'은 19세기 말 유럽을 지배했던 데카당스와 죽음에 대한 집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주의 회화다. 28세의 젊은 화가가 그려낸 이 충격적인 이미지는 세기말(fin de siecle)의 불안과 염세주의를 압축한 시각적 선언이었다.
작품은 세 개의 수직적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에는 금이 간 두개골을 가진 죽음의 형상이 연인인 듯한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고, 아래에는 죽은 여성의 창백한 나체가 누워 있으며, 그 위로 살아있는 남성이 슬픔에 잠겨 엎드려 있다. 이 극적인 구도는 중세 '죽음의 무도(Dance of Death)'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츠빈처의 기법은 놀랍도록 정교하다. 독일 아카데미 전통의 세밀한 데생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징주의적이다. 배경을 지배하는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부패, 독, 죽음의 상징이다. 왼쪽 위의 담쟁이 잎은 생명력을 암시하지만, 어두운 녹색 톤은 오히려 죽음의 정원을 연상시킨다.
여성의 창백한 육체는 고전적인 해부학적 정확성으로 그려졌지만, 그 차가운 흰색은 생명이 빠져나간 대리석 조각상 같다. 남성의 황토색 피부는 아직 생명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어, 두 신체의 색채 대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시각화한다.
1898년은 니체의 영향 아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하고,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세기가 끝나가는 불안 속에서 예술가들은 죽음, 섹슈얼리티, 데카당스에 집착했다.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구스타프 클림트의 관능적 여성상, 페르디난트 호들러의 죽음 연작이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다.
츠빈처는 독일 작센의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며, 아르누보와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의 몽환적 아름다움과 달리, 독일 상징주의는 더 어둡고 심리적이었다. 아르놀트 뵈클린, 막스 클링거 같은 선배 화가들처럼, 츠빈처는 죽음을 직접적이고 불편하게 제시했다.
작품은 프로이트가 말한 '에로스(삶의 본능)'와 '타나토스(죽음의 본능)'의 대결을 시각화한다. 남성은 죽은 여성을 껴안고 있지만, 그것은 성적 결합이 아니라 불가능한 소유에 대한 절망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슬픔은 육체적이고 원초적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죽음의 형상은 사랑하는 여인이 돌아올 수 없음을, 즉 불가피한 소멸을 상징한다.
츠빈처는 독일 아르누보 운동인 유겐트슈틸(Jugendstil)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작품의 장식적 요소들 - 양식화된 담쟁이, 평면적 배경 처리 - 은 유겐트슈틸의 특징이다. 그러나 주제의 무겁고 심리적인 강도는 곧 등장할 표현주의를 예고한다.
1900년대 초 드레스덴에서 결성된 '디 브뤼케(Die Brucke)' 같은 표현주의 그룹은 츠빈처 세대의 심리적 강렬함을 계승하면서, 형태를 더욱 왜곡하고 색채를 극단화했다. 츠빈처의 녹색은 아직 자연주의적 범위 안에 있지만, 그 상징적 사용은 표현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츠빈처는 1916년 46세의 나이로 요절했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거의 잊혀졌다. 20세기 모더니즘의 주류 서사는 추상미술과 아방가르드에 집중했고, 세기말 상징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징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츠빈처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드레스덴의 알베르티눔 미술관을 중심으로 재조명되었고, 독일 세기말 미술의 중요한 증언으로 인정받고 있다.
'슬픔'이 21세기 관객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는 죽음을 병원과 장례식장에 격리시켰지만, 상실의 고통은 여전하다. 츠빈처가 그린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슬픔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이 작품은 19세기 회화가 여성의 나체를 어떻게 대상화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기도 하다. 죽은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 예술가들의 반복적 모티프였으며, 이는 당시 젠더 관계의 권력 구조를 반영한다.
츠빈처의 '슬픔'은 아름답지만 불편한 작품이다. 죽음을 미학화하면서도 그 절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슬픔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냉혹한 인식이 작품의 핵심이다.
녹색 음영 속에서 세 개의 형상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 드라마를 연기한다. 죽음은 위에서 기다리고, 죽은 자는 침묵하며, 살아있는 자는 슬퍼한다. 1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츠빈처가 포착한 것은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영원한 조건이었다.
klifejourney2025@gmail.com
[저작권자ⓒ K라이프저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